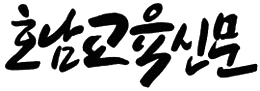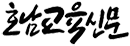가을의 한가운데. 강진의 영랑 생가를 찾았다. 매우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국어교육학회의 후배들과 함께하는 문학기행이었다. 영랑 김윤식은 1930년대 창간된 시 전문지 ‘시문학’을 창간하여 순수시 운동을 주도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세상에 나오게 된 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영랑의 삶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새로 단장된 ‘시문학파기념관’에서 과거로의 여행을 마치고 걸어 나오다 뜻밖의 ‘추억의 느린 우체통’을 만났다.
추억 우체통은 문학관 정원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유의 붉은 자태는 청명한 가을 하늘빛과 어울려 지나간 시간들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이와 어울려 생가 곳곳에 오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자리하고 있는 나무들은 형형색색 가을옷을 입었다. 100여년 전, 장광 옆 감나무잎을 보며 ‘오메, 단풍 들것네’를 읊조렸을 영랑의 누님이 시간을 건너 등장할 것 같았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우체통은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기구였다. 사람들 간에 문자로 소식을 주고받는 유일한 통로가 우체통이었다. 오늘날의 인터넷 메일 계정, 휴대폰의 문자앱이었다. 이 우체통은 국가에서 관리해 왔다. 1884년에 최초로 우정총국이 설립되어 업무를 했으나 1905년 을사늑약으로 통신권을 잃게 되었다. 광복 이후 체신부, 200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체통에는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대학 때 절친했던 친구는 진도의 섬마을에, 나는 신안의 섬마을 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서로의 외로움과 교직 생활을 전하며 주고받은 편지가 300여통이었다. 또 다른 섬마을에 근무하던 친구는 뜻밖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었다.
고통 끝에 회복되어 불편한 손으로 쓴 첫 편지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 뭉클하다. 무엇보다, 바다 건너 섬마을 학교에 근무하던 아내와 결혼 전 주고받았던 편지는 아직도 서재방 책장 위에서 현재의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때의 빨간 우체통과 하얀 손편지는 기다림이었고 반가움이었다.
퇴직하고 집에 머물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을 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편함 속의 우편물에 대한 감정이 예전과 다르다. 마냥 반가움이 아니다. 오히려 비어있는 우편함을 보며 안심하는 마음이 많아졌다. 고지서나 교통위반 통지서 등 부담스러운 소식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체통과 편지의 역할은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대체되었다. 옛날의 그것들은 더 이상 기다림과 반가움의 상징이 아니게 된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 오늘날은 초인종과 함께 문밖에 전해지는 택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추억의 느린 우체통은 전국에 280여개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에서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가 추억이나 소망을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1년 후에 본인에게 배달된다.
모든 것이 간단하고 빠르게 전해지는 최근의 통신에서 그나마 따뜻한 정과 느림의 미학이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이다. 이 가을, 어느 호젓한 산책길 위의 추억 우체통에 엽서 한 장 띄워보고 싶다. 1년 후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