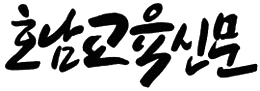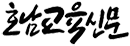올해도 봄날은 간다. 3월1일부터 시작한 봄이 3.1절 친일논쟁으로 데워지고, 4.19의거 민주화논쟁으로 달아오르다가, 광주 5.18로 부글부글 끓더니,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추념식으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봄은 만물이 약동하고 골목길의 티끌도 함께 반짝이는 계절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처님오신 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계절의 여왕이다.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무슨 친일 반일 논쟁으로, 무슨 진보 보수 투쟁으로 허무하게 지나가니 서글프기까지 한다.
‘봄날은 간다’는 1953년 대구 유니버설레코드사에서 가수 백설희 씨가 발표한 트로트다.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절, 너무 환해서 더욱 슬픈 봄날의 역설이 전쟁에 시달린 사람들의 한 맺힌 내면 풍경을 보여줬기에 이내 공감을 얻어 공전의 히트를 쳤다.
그 후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러 그 감동을 더해 갔지만 장사익이 불러 가슴을 후벼 파는 정한의 노래로 자리매김 되었다. 진정한 소리꾼 장사익이 내뱉는듯한 발성으로 부른 ‘봄날은 간다’는 묘한 슬픔을 우려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그래 한때 현역 시인 100명이 뽑은 애창곡 1위곡으로 자리매김 되기도 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 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도처에 얼룩진 전쟁의 상흔으로 생존 외에는 모든 것이 사치로 비쳐지던 그때, 그래도 삶이 있고 청춘이 있기에 연정은 꿈틀대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여인의 한이 느껴지는 곡이다.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소식도 알 수 없어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이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리라.
노래가 널리 알려져서 그런지 ‘봄날은 간다.’를 시로 쓴 시인도 많다. 박시교, 박이화, 길상호, 황동규, 이덕규, 정일근, 김용택, 강허달림 등이 ‘봄날은 간다’며 그 봄을 그 감을 탄식했다. 마당으로 출근하는 시인이라 불리는 정일근 시인은 ‘돌아보면 화무십일홍,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꽃이 날린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경꾼일 뿐이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우는. 누구에게도 그런 알뜰한 맹세를 한 적은 없지만 봄날은 간다. 시들시들 내 생의 봄날은 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용택 시인도 ‘꽃도 잎도 다 졌니라. 실가지 끝마다 하얗게 서리꽃은 피었다마는 내 몸은 시방 시리고 춥고 겁나게 춥다. 내 생에 봄날은 다 갔니라.’라며 가버린 봄날을 원망하고 있다.
‘봄날은 간다’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누군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내 인생의 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난 더 성숙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쩌면 사랑은 그렇게 식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식은 사랑의 위기를 넘겨 성숙하지 않으면 그 둘 사이에는 그저 흘러간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손로일 씨가 작사하고 박시춘 씨가 작곡한 ‘봄날은 간다’는 3절까지 있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 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청노새 워낭소리 나눠들으며 했던 별밤의 맹세, 그 약속 믿고 기다리지만 김소월의 진달래처럼 자꾸만 피맺힌 이별의 절규가 어른거린다.
슬픈 예감은 틀릴 줄을 모르고 적중해 속절없이 세월만 갔다. 그래 황혼을 맞아 연분홍 치마를 떠올리고 옷고름과 성황당 그리고 청노새 짤랑대는 역마차를 그려본다. ‘봄날은 간다’고 울었던 그 꽃다운 젊은 날을 회상하며 또 다시 ‘봄날은 간다’고 통곡한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앙가슴 두드리며, 뜬 구름 흘러가는 신작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그나저나 봄날은 간다. 아니 가야 한다. 그래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뜨거움으로 작열하는 용광로 같은 여름이 올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제 나 역시 고희를 넘겼지만 뜨거운 유월이와 살려니 가슴이 마구 뛴다.
상큼한 삼월이와 풋풋한 사월이와 그리고 따사로운 오월이도 나에겐 더할 나위없는 복이었다. 그러나 유월이가 뜨겁게 손을 내미니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될지언정 불덩이 유월이와 한번 살아보련다. 내 여윈 가슴속 심장이 뛴다. 쿵쾅! 쿵쾅, 쿵쾅! 쿵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