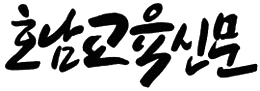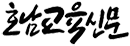교수 채용비리를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대 시간강사의 비극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매스컴도 연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45)씨는 교수 채용과정에서 돈이 오가고 논문 대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겼다. 서 씨는 유서에서 전남의 한 사립대에서는 6천만원,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서는 1억원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자신의 죽음을 스트레스성 자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서 씨는 “시간 강사를 그대로 두면 안된다. 수사를 의뢰한다”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도대체 대한 민국 사회는 언제까지 시간 강사의 죽음을 방치하려는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교수자리가 1억이니 2억이니 한 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서 씨는 1993년 서울 모 사립대 중어 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했다. 그는 조선대에서 1997년과 2002년 영어 영문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서 씨는 시간강사를 하는 8년간 20여차례 각대학 교수직에 응모했다. 대부분 2,3차 전형까지는 합격했으나 최종 전형에서 번번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서 씨의 월급은 130만원내외였다. 대학 4학년인 아들과 재수생인 딸을 가르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부인은 식당일을 나갔다. 가족 모두가 가장이 교수가 되는 날을 꿈꾸며 버틴 것이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일부 서울 소재 대학은 5억원, 경기도 소재 대학은 3억원, 지방대는 1억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소재 대학은 수천만원을 요구하는 현실에 번번히 좌절됐다.
서 씨의 자살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물론 조선대다. 지역 명문 사립대로서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그러나 많은 조선대 시간 강사들은 “곪아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간 조선대에서는 크고 작은 비리가 풍문으로 나돌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는 눈은 남다르다.
20여년간을 주인 없는 대학으로 남아 있다보니 너도 나도 주인 행세를 하는곳이 조선대다. 대학 민주화를 이뤘는지는 모르나 비리구조가 싹을 키우고 있지만 누가하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서 씨의 유서에서도 부끄러운 교수 행태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그런 처지를 서 씨는 “노예”라고 규정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강의했던 영문학과 A교수를 지칭하며 “왜 수시로 이용하려 하십니까. 더 이상 종의 가치가 없으니 버리려고 하십니까? 세상이 밉습니다. 한국대학사회가 증오 스럽습니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이 쓴 논문 54편 모두 제가 쓴 논문으로 교수는 이름만 들어갔으며 세상에 알려 법정 투쟁을 부탁 드린다”고 남은 사람들에게 당부했다.
이쯤되면 이제 조선대가 대답할 차례다. 사실을 파악해 지역민에게 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조선대 교수가 되려면 억대의 돈이 오간다는 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차제에 교수 채용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도 챙겨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학교 비리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따져 볼 일이다. 필요하다면 수사에도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서씨가 죽음을 불사하며 던진 물음에 답하는 길이다.
서 씨문제는 조선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열악한 8만 5천 시간강사의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박봉과 인격적 모멸을 견디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시간 강사 자살도 이미 10여 차례다. 숱한 문제에도 시간강사제도가 바뀌지 않는 데는 인건비를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의 편리함을 놓지 않으려는 대학쪽이 일차적 책임이 크다.
더 큰 책임은 힘없는 시간강사 처지를 알면서도 힘센 사학 재단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 있다. 이제 시간 강사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존재 문제와도 직결된다. 서 씨의 자살은 한국사회의 대학 존재가치를 묻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속에서 대학이 더 이상 필요한지 묻고 있는 것이다.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언젠가 교수가 되는 날 당신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는 서 씨에게 우리는 할말이 없다. 이번에도 매스컴에서 며칠 떠들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서 씨의 죽음이 더 짠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