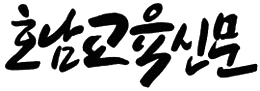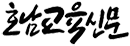우리는 흔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 중얼거리며 염불(念佛)하는 스님들을 흔히 만나 볼 수 있다. 바로 이 염불을 창시한 사람이 혜원이다.
혜원(333년-416년)은 중국 동진(東晋) 때의 승려로서, 화북 지역에서 도안에게서 배운 다음 강남으로 내려와 구마라습 등의 교학적 흐름을 이어받았다. 그는 ‘과연 사문(출가해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왕에게 경배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 혹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 영혼이 불멸하느냐’의 문제와 씨름하며 대결해나갔다.
또한 불교 경전의 번역을 중하게 여겨 구마라습 등에도 그 사업을 권고했고, 그 스스로도 '아비담심론', '대지도론' 등에 서문을 지어 붙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여든 세 살이 되던 해 8월 초,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병의 증상은 매우 위태롭고 중했다. 제자들과 수많은 인사들이 그의 옆에 둘러앉았다.
의사가 고주(鼓酒, 술을 거르거나 짜는 틀)로 만든 탕약을 그에게 마시도록 하자, 그는 냄새를 맡고는 입을 떼었다.
“주기(酒氣)가 있구나. 술이로군. 그렇다면 난 마실 수 없네” 이에 그의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다. “선생님, 이것은 술이 아니라 약입니다. 한 사발만 드시지요.”
그러나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신음하듯 대답했다. “술은 오계(五戒, 불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금지사항)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내가 거스를 수 있겠는가?” 의사는 딱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렇게 권했다. “그럼 미음으로 고주를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여전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에 의사는 재차 다그쳤다. “그렇다면 밀즙(蜜汁-꿀벌이 분비하며 벌집의 주성분이 되는 물질)에 물을 타면 어떨까요?” 주위의 사람들도 간곡히 권하였다. 그는 한참 신음하던 끝에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좋아. 자네들은 계율을 찾아보고,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게나.”
그러나 제자들이 계율을 절반도 찾아보기 전에 혜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속과 단절하기 위해 37년 동안 여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혜원, 그가 마지막 장면에서도 지나치리만치 의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혜원의 제자인 도생(372년-434년. 동진의 승려)은 사람마다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천제(闡提-부처가 될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또한 사람이기에 불성(佛性)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마땅히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로 인해 많은 승려들로부터 배척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이 있은 지 3년 후, 인도로부터 전해져온 대열반경에는 “천제지인도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이때부터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예순 살의 그가 여산의 동림사에서 불법을 강의할 때는 온 산이 사람들로 뒤덮였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어느 겨울, 여전히 그는 여산의 동림사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열반경(涅槃經),석존의 입멸에 관해 설명한 경전)의 강해가 막 끝나갈 무렵, 그의 손안에 들려 있던 사슴 꼬리가 땅에 떨어졌다. 모두들 깜짝 놀라 달려갔을 때는 당대의 고승이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의 죽음은 온 도시를 진동시켰다. 그가 죽자 일반 명사와 고승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전에 그를 몰아냈던 혜의 등도 와서 애도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