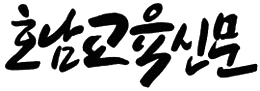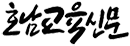교문에 들어서면 히말리야시다 나무가 반겨 준다. 학교의 역사가 꽤 되리라는 걸 큰 키에서 짐작한다. 초록의 인조 운동장과 알록달록한 본관 건물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올해 개교 100년을 맞아 세운 자연석의 기념비가 서 있다.
정리는 잘됐으나, 인근의 학교처럼 운동장을 빙 둘러서서 위용을 자랑하는 커다란 나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는 삭막한 편이다. 운동장과 주택의 경계 면에 서 있는 아왜 나무 여섯 그루는 키가 나보다 작다.
주민의 민원으로 키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멀리 체육관 앞에 은행나무 서너 그루가 보이지만 가지를 심하게 자른 탓에 제멋대로 자라서 볼품이 없다.
그런데 뒤뜰로 가면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급식실과 유치원을 지나면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뜰이 나온다. 10년 전에 만들어진 학교 숲이 그곳의 반을 차지하고, 그 너머엔 아이들이 가꾸는 작은 텃밭과 비닐하우스, 그리고 아무 것도 없는 맨땅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홍가시나무와의 사이에 있다.
교장의 안목에 따라 수난을 겪는 나무
‘교장이 바뀌면 나무가 수난이다’는 말이 있다. 관리자의 안목에 따라 분교에서 본교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 가는 나무의 처지를 빗대 하는 말이다. 그 과정에서 잘리고, 죽기도 한다. 지금은 나무도 학교 재산으로 관리하기에 한두 사람 맘대로 할 수 없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20년 전, 모교에 근무할 때였다. 출근하니 교문 주위가 요란했다. 운동장 양쪽에 있는 플라타너스 두 그루를 자르면서 나는 소리였다. 한쪽은 이미 잘린 상태였다. 교사들과 아이들이 다 놀랐다. 자신들의 추억이 묻은 나무를 왜 자르느냐고, 그 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던 새들이 다 떨어져 죽었는데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다. 황당하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체육관이 없던 그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면 우리 반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던 나무였다. 교직원 간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오직 교장 맘대로 벌인 일이었다. 학창 시절 나도 친구와 그 나무 아래서 공기와 철봉 놀이를 오후 내내 한 기억이 선명했다. 물론 털이 수십 개 달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쐐기가 뚝뚝 떨어져서 질겁한 일도 있었지만.
급기야 교육청 누리집에 학부모 민원 글이 올라왔다. 교장은 교무 부장을 시켜 답했다. 키가 너무 커서 본관 건물 쪽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다, 방역이 어렵다, 무엇보다 꽃가루가 날리는 봄이 되면 학생들 건강에 안 좋다 등의 이유를 댔다. 그 나무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람했으니 아마도 40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단순히 자르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중장비로 어마어마하게 큰 구덩이를 파서 뿌리는 물론, 줄기와 잔가지까지 모두 묻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러 날 마음이 아팠다. 6학년 우리 반 아이들도 서운하고 속상한 심정을 일기에 적었다. ‘그 큰 나무를 그토록 무참하게 자른 교장의 말로는 좋았을까?’ 간혹 궁금하다.

경쟁에서 밀린 벚나무와 목련이 잘릴 위기에 처해
얼마 전 실장을 따라 뒤뜰에 가니 교육청에서 나온 낯익은 팀장과 처음 보는 아저씨가 있었다. 청에서 관리하는 여섯 개 학교의 나무 전정 작업을 맡은 조경업체 사장이라고 실장이 소개했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관계자가 현장에 모인 것이다.
그곳은 관사 뒤쪽으로, 평소에는 교직원이나 아이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밑동도 튼튼한 잣나무가 가운데 있고 목련과 벚나무가 양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런데 깃털처럼 푸르고 고운 잎을 달고 있어야 할 잣나무에 누런 잎이 꽤 보였다. 좌우에 있는 목련도 이파리는 많으나, 거무튀튀한 점박이에다 잎 표면이 끈적였다. 그쪽으로는 문외한인 내가 봐도 병이 든 걸 알 수 있었다. 키가 훌쩍 큰 벚나무도 잣나무와 가지가 뒤엉켜 있었다.
조경업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좁은 지역에서 경쟁하느라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며, 비싼 잣나무만 살리고 다 베어야 한다고 했다. 구석진 곳이라 평소에는 눈길조차 닿지 않지만 봄이 되면 화사하게 꽃을 피우며 존재를 알리는 게 벚나무와 목련 아니던가.
가슴 아팠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파서 옮기는 데는 기천만 원이 든단다. 이 학교 근무 기간에는 나무 한 그루도 해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다른 학교보다 부지가 월등하게 넓은데 왜 이렇게 심었는지 맨 처음에 자리를 지정한 사람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늘어 가는 수목장도 그래서일 것이다.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당산나무는 수령 몇백 년을 훌쩍 넘긴 나무도 흔하다. 인간이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전부터 마을의 희로애락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것이다. 단지 지구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나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
다음 날 다시 그곳을 찾았다. 머잖아 사라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안아 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지켜 주지 못해서 미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