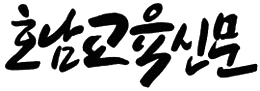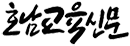조귀순 여사가 귀천한지 오늘로 근 일 년이 다 돼간다. 조 여사가 홀로 살던 외딴 집은 긴 장마에 젖은 채 태극기만 졸고 있고, 조 여사가 조석으로 벌어먹었던 땅은 윤기를 잃은 채 이름 모를 잡초만 무성하다.
다른 이들은 좀처럼 드나들지 않는 그래서 조 여사 전용이 되다시피 한 조 여사 집 들어가는 길은 지금 적막만 켜켜이 쌓여간다. 조 여사는 아시내에 시집와 88세 생을 살다 별나라로 갔다. 살아생전 조 여사는 군서면에 있는 마을 이름인 백암동댁이라고 불렸으나 기실은 백암동 마을이 친정 동네는 아니다.
조 여사는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마저 일본으로 건너간 뒤로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장성의 어느 마을에서 애기 담살이로 남의 집 살이가 시작되었는데 주인집 딸이 백암동에 사는 창녕 조씨 성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 그 신부를 따라 백암동에 살게 됐다.
그리고 그 댁에서 주인의 배려로 창녕 조씨라는 성을 받았고 귀하게 살라고 귀순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혼기가 되자 백암동 창녕 조씨 집안이 친정인 아시내에 살던 아낙의 중매로 전주 이 씨 성을 가진 총각에게 시집와 백암동댁이란 택호를 갖게 된 것이다.
백암동댁의 아시내에서의 삶은 출생에 비해 비교적 순탄하게 출발한 것처럼 보였다. 시대의 가난인 절대빈곤을 피해 갈 수는 없었지만 수더분하게 생긴 낭군과 아들 셋을 낳으며 새로운 운명을 창조해 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건장한 남편이 갑자기 대낮에 급체로 유명을 달리하고만 것이다.
그리하여 핏덩이 같은 아들 셋과 함께 다시 광야에 내동댕이쳐진 백암동댁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이 다시 시작되고만 것이다. 땅이라곤 비땅밖에 없는 백암동댁 조귀순 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뚱이로 할 수 있는 날품팔이뿐이었고, 아들 셋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돈벌이가 더 되는 노동 강도가 센 건축 공사장 기능공 보조 일이었다.
그래 조 여사는 닥치는 대로 시멘트 미장 보조로부터 벽돌 조적 보조, 더 나아가 서호강 모래자갈 채취일까지 여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만을 골라 억척스럽게 해가며 길고도 긴 하루해를 살아냈다. 그때 백암동댁이 냇가에 모래자갈을 채취해 쌓아두면 트럭이 들어와 실어갔고, 그러다 갑자기 비가 와 냇물이 불어나면 쌓아둔 모래자갈이 물에 쓸려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래 당시 백암동댁의 일하는 모습을 안쓰러움을 넘어 성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다 농장 품팔이 끝에 운이 좋게도 품을 동원하는 작업반장 역할을 맡게 됐다. 자신도 품팔이를 하면서 농장에 품을 동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백암동댁은 무학으로 글을 알지 못했으나 그 많은 인부들의 전화번호는 다 외워 일일이 밤에 전화를 하여 인부를 끌어모으는 일을 너무나도 잘해냈다.
그래 농장의 주인은 누구보다도 백암동댁을 믿고 일을 맡기기도 했다. 당시 백암동댁이 근동에 사는 그 많은 아낙네들 집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다 외워 기억했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러는 동안 아들 셋은 그래도 잘 자라 제 갈 길을 가 주었다. 잘 자란 아들 셋은 조 여사에게 장한 어버이 상을 안기기도했다.
많이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제 몫을 해 주었고, 어머니 품을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백암동댁의 힘이 돼주었다. 조 여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백암동댁은 저승 갈 노잣돈은 스스로 벌어놔야 한다며 계속해서 인력시장으로 나아갔고 낙오되지 않으려고 언제나 인력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했다. 그래 죽기 2,3년 전까지도 인력시장의 일을 놓치지 않고 간헐적으로 진출했다.
거의 말년에서야 너무 늙었다고 찾아주지 않자 남들이 벌지 못한 땅을 벌며 농사가 위주인 삶을 영위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외면하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고집스럽게 농사일을 했다. 온 동네 담벼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깨를 심어 담에 말렸고 자기 집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마늘을 심어 갈무리하기도 했다.
잘 사는 아들네들이지만 아들네 집에 많은 농작물을 택배로 상시로 부치곤 했다. 마늘 까서 부치고, 완두콩 따서 부치고, 감 따서 부치고, 참기름 짜서 부치고, 쑥떡 해서 부치고, 김장해서 부치고, 부치고 부치는 것이 백암동댁의 존재 이유였다. 자식에게 결코 짐이 되지 않는 어미,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어미가 되기 위해 하루해를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항시 자식 성가시게 하지 않고 일하다 밭둑에서 갑자기 고꾸라져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조 여사는 살면서 비록 창녕 조씨 댁이 친정은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 의지했고 교류를 끊지 않고 항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옆에서는 혼자 살지 말고 서방 하나 얻어 살라고, 자식들 교육시키려면 돈 많은 늙은 홀아비라도 얻으라고, 몸뚱이 조금이라도 팽팽할 때 살 섞고 살라고, 비웃음 반 놀림 반으로 가지가지로 속삭여도 백암동댁은 먼 하늘을 쳐다보며 뜨거운 여름날을 견뎌냈고, 옆구리 시린 가을날을 건너왔다.
조귀순 여사는 죽기 직전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부부요양병원에서 아들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운명했다. 조 여사는 말년에 좀체 잘 나오지 않은 마을 회관에 나와 동네 분들과 지내기도 했는데, 큰 아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상급학교 진학을 못 시켜준 것에 대해 무척이나 미안해하고 아쉬워해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지금 마을 사람들은 외따로 떨어진 조 여사 집을 멀리서 바라만 볼 뿐 결코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나 정갈하게 살림하고 손맛 나게 음식을 마련했던 그 집이 그리워 혼이라도 와 있을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외롭고 서럽게 살다간 집이라 조 여사 눈물이 한동안은 집을 지킬 것 같기도 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