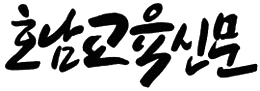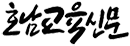결국 해냈다. 그녀가 집 떠난 지 41일 만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왔다. 지난 2월에 37년을 근무한 교단에서 명예퇴직한 언니는 딱 한 달을 쉬고는 남편과 산티아고로 떠났다. 간간이 그녀의 카톡 사진을 보면서 여정을 짐작했다.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남녀가 파란 하늘 아래 황토길을 걷는 풍경이나 광장 한가운데를 내려다보며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의 뒷모습도 있었다. 늦은 밤 알베르게(숙박 시설의 한 종류로, 약 800km에 이르는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찾아드는 지친 그녀 남편도 조그맣게 보였다.
햇살 아래 기타 치며 노래하는 수녀, 스테인드글라스로 화려하게 장식한 성당 내부, 뾰족뾰족 하늘을 향해 솟은 고딕 양식의 건물 외관도 자주 등장했다. 한 달이 넘어가자, 파란 바탕에 진노랑의 빛살이 한 꼭지점에서 열한 군데 방향으로 퍼진 산티아고 순례길 이정표와 남은 거리가 화살표로 표시된 비석이 자주 올라왔다.
마지막 날에는 다리 하나로 땅을 짚고 두 팔과 한 다리를 경쾌하게 치켜든 채 활짝 웃는 사진이 보였다. 오직 두 다리로 해냈다는 뿌듯한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그 길을 완주한 사람만이 느끼는 자유였다. 그녀의 환한 미소가 아름다웠다.
뒤로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성당이 있었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곳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지에서 만나는 성당으로 무려 천 년 전에 지어졌다.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꿈꾼다. 버킷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기회만 되면 닿으려고 한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과거에는 종교적 의미가 강해 카톨릭 신자들이 주로 찾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인의 길이 되었다.
한때 잊히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2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을 방문하면서 다시 인기를 얻었다. 게다가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를 출간해 그 인기에 불을 지폈다.
그리하여 1993년에는 길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코엘료가 그 길을 걷던 당시 1년에 400명이 걸었다면 책이 인기를 얻은 뒤에는 하루에 400명, 이제는 수천 명이 그 길 위에 있단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요즘은 여행자가 늘어서 방 잡기도 어렵다고 했다.
순례길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간 사람은 드물다는 말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지인도 그렇다. 그녀는 남편과, 언니 부부와 넷, 그리고 언니와 단 둘이서, 이제까지 세 번이나 다녀왔다. 그런데 또 내년 봄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행기와 열차, 버스와 자동차가 버젓이 다니는 21세기에 그 먼 거리를 뚜벅뚜벅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로만 이동하다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방은 좁고 불편하며 몸은 천근만근일 터인데 기꺼이 고행을 감내하면서 왜 그 길에 서려고 할까? 언니는 그 길에 중독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했다.
‘잘 지내지? 새벽에 나서서 오후 두 시나 세 시가 되면 알베르게에 도착해. 샤워하고 빨래하고 먹고 자는 일이 전부라네. 언덕에 올라 내려다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아스라한 길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어느새 목적지에 닿게 되더군. 일주일째가 고비라는데 오늘은 걷는 중에 나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 뭐 하러 여기 왔지? 편안한 집을 두고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꿈꿔 오던 일을 이룬 것에 감사하기만 했는데 오늘은 다른 기분이 들었어. 그곳은 한밤중일 텐데 옛 수도원을 숙소로 만든 이곳은 참새가 쉬지 않고 짹짹거리네.’
8일째 되던 날 안부를 묻는 내게 언니가 보내온 톡이다. 어쩌면 비우려고 떠나는 모양이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물건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햇볕이 내리쬐건 비가 내리건 상관없이, 그저 걷는다. 많은 짐도 필요 없다.
갈아입을 옷 한 벌이면 된다. 다음 끼니의 도시락은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세 가지 메뉴에서 골라야 한다. 오직 먹고 자는 그 단조로운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나 보다. 어쩌면 순례길은 정든 교단을 떠나는 언니가 남기는 매듭이 아니었을까.
나도 한때 꿈을 꾸었다. 크게 아프고 난 뒤에는 하루 종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움직일 자신이 없었다. 보통은 20km, 다음 알베르게까지의 시간이 어중간하거나, 묵을 방이 없으면 30km 이상을 걷는 날도 있다고 들었기에.
그런데 세 번이나 다녀온 지인이 그런 걱정은 필요없단다. 다음 숙박지까지 전문적으로 짐을 날라다 주는 교통편도 있으니 주머니만 넉넉하면 된다. 행여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픈 날에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단다.
언젠가는 나도 저 길 위에 있으리. 머리를 비우고, 가장 단순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해 다시 날아오를 힘을 얻으리.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