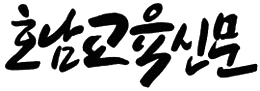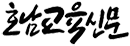활자매체를 통해 한 사진작가의 초상을 들여다본다는 건 올 여름 책을 읽는 즐거움 중 하나다. 생시의 조우처럼 역동적이고 생생한 느낌에 못 미치더라도 보고 읽고 진한 느낌을 더해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게다가 이 작가가 살아서 보다 사후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화려하게 받는 존경받아 마땅할 작가라면 더욱 흥미진진하고 즐겁게 정독할 일이다.
앞서 이야기한 흥미라는 말은 관념의 오류일성 싶다. 흥미라기보다 작가에겐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요, 죽음보다 더한 치열한 삶이었으니 어떤 수식어로 위로를 보낸다 한들 살아남은 자는 죄(?)일 수 밖에 없다. 그의 작품 한 점 제대로 볼 수 없는 범인(凡人)이 느끼는 감동이란 지평선에 서 있는 한 그루 느티나무만도 못하다는 생각에 책을 잠시 덮는다.
일정한 거처도 없이 제주도를 방랑하다 요절한 사진작가 ‘김영갑’, 끼니를 밥 먹듯 거르면서 작업에만 매달리다 임종도 없이 홀로 쓸쓸히 마감한 삶에 그의 나이 48세, 삶이 극적이기에 죽음도 극적이었을까? 원인은 근육이 굳어지는 희귀병인 ‘루게릭병’이었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셔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곳, 작가의 피 말린 유작들을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갤러리 두모악’이다.
모름지기 사진작가들이란 풍경을 살해하는 범죄자인지도 모른다. 빛과 어둠의 무채색을 해체하거나 결합시켜 천연색조의 찬란한 풍경을 조형해 내는 마법의 눈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기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작가만이 낯익은 풍경을 낯설게 포착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풍경을 토막 내어 깊은 통찰력으로 해석하여 또 다른 자연의 풍광으로 재생산해 내는 것을 보면 외경스럽기까지 하다.
그가 뷰파인더로 바라보는 세상이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겠으나 피사체에서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을 순간 포착해 내는 솜씨는 가히 일품이다. 요동치는 바람의 족적을 생생하게 잡아낸다거나 왕의 거대한 무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생화산의 하나인 ‘용눈이 오름’을 유채꽃 물살에 씻어내고 있는 것 같은 미적 표현력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작가의 혼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작품이다.
충남 부여 출신의 김영갑은 사진 작업 차 제주도에 왔다가 풍광에 빠져 섬사람이 되었단다. 산과 들, 바람과 돌, 오름과 초원으로 상징되는 섬 문화에 매료된 그가 그냥 구릉성 산지나 버려진 무덤으로나 생각했을 여러 ‘오름’에 대해 유독 집착을 보인 것은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행여 그가 제주도에 흩어진 ‘오름’을 평생 반려자라 생각하며 홀로 사는 즐거움을 만끽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니 말이다.
적어도 직업의식에서만큼은 그는 철저한 에고이스트였다. 풍경 사진만을 고집했던 것도 그렇고, 이유 없는 보상을 철저히 외면했던 일도 그렇다. 인간관계 또한 그러했으니 그의 작품 속에서 인물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사진작가가 최고 경지에 이르러서야 인물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다 하니 그는 겸손할 줄도 아는 작가인가 보다.
올 여름방학, 작가의 사진 수첩인 ‘그 섬에 내가 있었네.’, ‘김영갑 5주기를 추모하며’라는 제목의 책을 권하고 싶다. 사진에 문외한일수록 더욱 좋다. 한 컷의 풍경 사진을 보고 편안함이나 삽시간의 황홀을 느끼면 그만이다. 작가의 파노라마 같은 삶의 족적을 애써 찾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의 삶 모두가 파노라마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