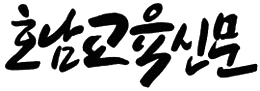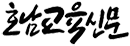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대판 특권층 벼슬 대물림이라고 불리는 음서제(蔭敍制) 실시를 두고 또 분란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음서 또는 음서제라는 고위공무원 선발제도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제도(科擧制度)와 같은 선발방식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서류와 면접만으로 고급관리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서민이나 하층민에 속하는 다수의 일반인들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오로지 국가공채라는 이른바 각종고시(各種考試)를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창구로 활용되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음서제 도입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어서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를 이해할 수 없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사회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가운데 관직의 세습마저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가난한 젊은이들이 서야할 자리가 자꾸 줄어들 게 뻔하다. 가문이 좋거나 명문대학 동문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못할 세상이 올 것이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대학을 졸업했고 아직도 취업이라는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올여름 도서관에서 혹은 쪽방에서 부실한 끼니와 함께 혹서를 이겨내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척도로 고위관료를 임용하는 일은 없겠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부지기수인 한국사회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사회가 아직 미성숙 단계에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고시를 꿈꾸고 있거나 준비생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어서 만약에 원안대로 강행된다면 관직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해버리는 고약한 제도를 없애라며 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국가적인 인적․물적자원의 낭비가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고급공무원 임용제도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단지 서류와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판단하고 등용한다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설움을 겪는다는 걸 정책입안자들은 재삼 숙고해 볼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문화는 지연이나 학연, 혈연을 중시하는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매번 임명되는 정부 여러 요직에 발이라도 붙이려면 썩은 권력의 동아줄이라도 잡아보려는 게 현실이다. 누가 아무런 연고도 친분도 없는 사람을 서류와 면접만을 통해서 고위직에 과감히 등용해 줄 것인가 그게 염려가 되는 것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사회현실이 안타깝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하다. 아예 꿈을 접고 제 갈 길을 알아서 찾아가라는 경고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헌법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을 정면으로 배치하면서까지 이 개선안을 꺼내든 정책입안자도 그렇지만 공론 과정도 생략한 채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위험한 것이다. 이 땅의 서민을 두 번 울리게 하는 음서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확대해석하자면 학교라고 해서 이 제도의 취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직도 학교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말이다.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이 교사의 수업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교원인사의 근간자료로 삼거나 어느 교육감의 말대로 펴가 결과 하위성적분포 대상자 10%를 퇴출시키는 도구로 변질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들을 종종 보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대판 특권층 권력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음서제를 전면 재검토하든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성숙될 때까지 보류해야 마땅하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규칙과 투명한 기준에 의해 관직에 진출하는 창구마저 닫아버린다면 희망을 꿈꾸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장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