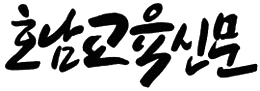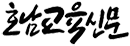지난 일요일 오후, 아내가 영화를 보러가잔다. ‘노무현입니다’를 보자는 것이었다. 아내는 “휴지를 챙겨야겠다.”며 가방을 든다. 사람들이 극장에 몰릴 시간은 아니었는데도 영화 상영관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했다.
일반적인 대중영화 상영관과는 사뭇 다르게 지긋한 연배의 관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우리가 구매한 좌석에는 칠순의 할머니들께서 좌석을 잘못 찾아 앉아있었다. 불편해하실 것 같아 우리 자리라며 굳이 자리를 비켜 달라 하지 않고 우리 부부는 다른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예상했던 대로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을 훔치느라 바빴다.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저 우리의 대통령이었던 ‘바보 노무현’의 인생이 내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었다. 비단 나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내는 울컥거리는 상황마다 내 손을 지긋이 잡고 있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자꾸만 지난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던 시간이 스크린에 오버랩(overlap) 되고 있었다.
그날 이야기에 앞서, 내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이들에게 자주 인용했던 내용을 먼저 밝히고 지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나는 국어교사였다. 이제는 다시 국어교사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일상처럼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매년 첫 국어수업 시간이면 아이들에게 허균의 '호민론'을 설명했다.
'호민론'에서 허균은 백성을 항민, 원민, 호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항민은 윗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면서 얽매인 채 사는 사람들이다. 원민은 수탈당하는 계급이라는 점에서는 항민과 마찬가지이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윗사람을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이들은 원망하는 데에 그칠 뿐이다. 그러므로 항민과 원민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못 된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호민이다. 호민은 남모르게 딴마음을 품고 틈만 엿보다가 시기가 오면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가 받는 부당한 대우와 사회의 부조리에 도전하는 무리들이다. 호민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 원민들이 소리만 듣고도 저절로 모여들고, 항민들도 또한 살기를 구해서 따라 일어서게 된다“고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다.
허균의 '호민론'은 ‘국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의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강조하여 백성의 위대한 힘을 자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허균의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특히나 그의 소설에서 설정한 주인공 홍길동의 캐릭터는 호민의 그것과 너무나 유사하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가정에서의 신분적 제약과 사회에 등용되지 못하는 사회적 모순에 부닥쳤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는 호민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호민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1992년 새내기 교사로 울산에서 근무하던 필자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인 광양에 와서 쉬고 있을 때, 여수 YMCA에서 주관한 대학생들을 위한 캠프 강사로 당시 ‘변호사 노무현’이 하동 송림 백사장에 왔던 이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연한 기회로 그 자리를 참석해서 ‘바보 노무현’을 직접 보게 되었다.
1992년 여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동구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여 낙선했을 때였다. 그날 소박한 옷차림으로 연단에 오른 노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드시 시민사회의 힘이 역사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었다. 1992년은 3당 합당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자유당(민자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상황이었다.
무대 앞 모래밭에 앉아서 노 전 대통령의 강연을 듣는 내내 필자의 머리와 가슴으로 그 분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무척 힘들었다. ‘왜 저 분은 굳이 저토록 어려운 방법으로 정치인의 길을 가고 있을까? 김영삼의 곁에 있었으면 쉽게 정권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백사장을 넘실대는 강물처럼 밀려들었다. 어쩌면 ‘저 분이 대한민국 현실 정치판의 진정한 호민이 아닐까?’ 싶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겠다고 했다. 나도 몰래 손을 들었고 노 전 대통령은 나에게 질문을 허락해주었다. “변호사님, ‘깨어있는 시민’이 이번 92년 대선에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대선주자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너무도 당돌한 질문 앞에 강사는 차분하게 답해주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번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했던 답이기도 했지만, 출신 지역의 한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자신의 지역 출신이 아닌 진정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다수의 청자들에게 호남의 정치세력이 이 나라 정권의 수장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유로 장황하게 설명해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동서화합의 형식적 균형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도 그해 겨울 울산의 새벽바람을 가르며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비판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하기’로 한 교사단체의 결정에 따라, 홍보물을 남몰래 뿌리고 다니던 울산의 많은 건강한 선생님들을 기억한다. 그들과 함께 했던 지난날들이 영화화면 속에 겹쳐 지나가면서 더더욱 ‘바보 노무현’의 인간적 삶과 정치적 역정을 바라보는 눈시울은 휴지를 든 내 손길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번 아이들에게 '호민론'을 이야기 하고 나서 “선생님은 늘 원민 정도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고 고백을 했다. 새내기 교사 시절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나는 ‘원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세로 적당히 시대의 흐름에 실려 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 위대해보였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정말 객관적으로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붙이는 별명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논리에 따라 대중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하거나 또 그렇게 행동하는 소수를 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바보 노무현’이라고 부를 때 그 바보 또한 후자(後者)에 해당할 것이고 말이다. 그해 여름, 하동 송림에서 만난 이후 꼭 10년이 지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다시 1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극장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다큐 영화가 ‘호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국민적 기대감과 어우러지고 있다. ‘바보 노무현’이 아니라, ‘당연한 시민, 깨어있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 노무현’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인식 수준을 기대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