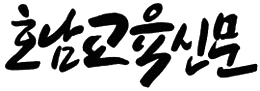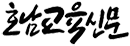정영희∥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물오징어 파는 포장마차 포렴(布簾)을 접기 전까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손님을 끌어 모아야 한다. 좌판행상도 마찬가지이기에 적지만 마지막 떨이의 순간까지 자기만의 전술전략으로 매상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그러므로 보따리를 풀었다 금방 쌀망정,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 게 외로운 섬, 새들의 고향 울릉도 사람들의 생존법칙이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암벽 통로에서 책으로 그늘이나 넘기며, 햇빛을 등지고 앉아있는 그녀가 궁금하다.
울릉도 피데기* 파는 젊은 여인네 이야기 좀 해야겠다. 해안 산책로에서 만난 그녀는 손바닥만 한 책보자기를 널게 펴 너 댓 마리 피데기를 던져놓고, 사거나 말거나, 마르거나 말거나, 수평선이나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사가 해결되는 모양새다. 흥정하는 이도 없고, 눈 맞추는 일도 없어, 이미 장사는 포기한 거나 진배없으니 속세와의 인연을 냉혹하게 잘라버린, 저 먼 섬을 떠도는 나그네 정도라고 해야 맞겠다. 피데기가 있으면 캔맥주라도 곁에 있어야 손님이 제 발로 찾아올 텐데, 그런 수완도 없으니 이건 장사꾼이 고객을 무시하는 처사가 분명하다. 아니 그녀는 장사꾼임을 포기한 것이다.
절박함이 없다. 그냥 바다 냄새가 좋아서일까, 반찬값이라도 벌어볼 요량인가, 아니면 휴가를 핑계 삼아 잠시 책장을 이곳으로 옮겨놓은 것일까? 병풍처럼 둘러친 암벽을 배경으로 여인은 독서삼매경에 풍덩 빠져있다. 이미 피부가 벌겋게 익은 피데기는 코발트 빛 바다로 뛰어들 기세였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후미진 계단을 돌아 나오다가 한참 동안 뒷모습을 훔쳐본다. 책의 행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벌이를 이미 포기한 채, 석불처럼 앉아있는 그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없어 답답하다.
고전에서 만나는 선비들의 여름나기를 읽는 것 같다. 아마, 그 여인은 여름휴가 목표를 쉴 새 없이 책장 넘기기에 뒀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맑고 찬란한 풍광이 물빛에 반사되는 섬에서 바다를 접어두고 책만 읽고 있으니 말이다. 아니면 촛대바위 집어등으로 오징어 잡는 비법을 찾거나 책갈피에서 바다 시 한 편과 조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부지런히 산자락을 붙잡고 오르내리는 버스 바퀴에 비하니 그야말로 태평성대다. 태평양의 고독한 육지에서 피데기가 아닌 책 읽는 여인을 만난 것은 내겐 꽤 감흥적인 일이다.
책에 홀려 장사를 포기한지 오래다. 피데기가 낮잠 든 사이 책장을 넘기고 있다는 게 맞겠다. 대구, 명태, 거북이도 덩달아 자취를 감춘 동해에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책장 다스리는 일뿐이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벌이를 위한 좌판을 함부로 팽개쳤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말치레도 볼륨을 끈 지 오래이리라. 눈을 돌리니 시간이 멈춘 물결 너머, 독도 행 뱃고동에 다리가 찢어져라 뛰어가는 괭이갈매기가 부산하다.
휴가는 휴가일뿐이다. 재충전의 시간이라며 떠들썩하다가도 곧 잠잠해지는 게 휴가의 속성이다. 차가 밀리고, 사람에게 치이고, 바가지타령에, 소음에 찌들고, 어쩌다 그럴듯한 쉼터라도 찾았다 싶으면 자리다툼에 한숨이다. 짐작건대, 휴가 와중에 많은 사람이 혹시나 ‘휴우, 집에 가서 얼른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겠다. 그러니 알고 보면 휴가는 아마도 윗글의 준말일 듯하다.
도동항 해국(海菊)군락이 바닷바람에 곡예를 하고 있던 해변 산책로, 피데기는 접어두고 한가로이 책장을 넘기던 그 여인의 진짜 속셈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도 궁금하다.
딩동댕, 지난여름….
딩동댕, 지난여름….
* 덜 건조된 오징어를 부르는 경상도 사투리
저작권자 © 호남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