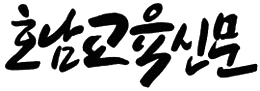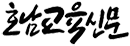김재흥∥송광초등학교 교장

밭둑을 걸으며 봄을 찾았다. 곳곳에서 봄풀이 꼼지락거리며 덤불을 밀어 올리고 있다. 겨우내 냉골 같은 찬바람에 속살을 비비며 봄을 깨우는 전령들의 신음이 도처에서 토닥거리고 있었다. 산과 들을 거닐어 보지 않고 방에서만 봄을 맞이하려 했던 철없는 게으름으로 봄에 대한 불손한 과오를 저질렀음에 무안해진 마음을 꾸짖었다. 봄은 이렇게 우리 곁에 이미 다가왔는데도 말이다.
파릇한 내음을 따라 걷다가 들판으로 난 들길로 향했다. 들길이라는 말보다는 농로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은 예전의 그 들길이 아니었다. 졸졸거리는 물길이 구부러진 논둑길과 사이좋게 어깨를 걸고 들판에 누워있으면 구름이 내려와 멱 감던 그런 길이 아니었다. 논둑길 밑으로 난 물길에 손을 집어넣으면 미꾸라지 두세 마리는 거뜬히 잡아 올리던 물과 흙길이 뒤섞여 파닥거리던 그런 도랑은 이제 사라진지 오래다.
이 들판은 풀 한 줌 들어설 틈이 없는 딱딱한 시멘트 덩이가 구획한 바둑판이라 해야 옳다. 정교한 사각의 링으로 포석해버린 농로에서 어릴 적 경험을 찾기엔 무리였다. 간신히 찾은 보리밭에 발을 내딛었다. 냉해와 서리로 핏발이 선 보리밭을 밟아주던 아련한 유년의 기억 때문이었다. 추위를 동여매고 공중으로 들려진 뿌리를 홀라당 벗고도 보리는 씩씩한 푸릇함을 잃지 않는다. 가히 한 겨울 추위를 제압한 들판의 제왕답다.
흙의 성긴 빈틈을 내어 준 보리를 살며시 밟아 본다. 푸석한 흙의 감촉이 물컹하게 눌려지며 보리가 납작하게 엎드린다. 그가 견뎌온 겨울의 무게와 삶의 촉수도 잠시 흙의 온기 속에 묻어 놓고 내일은 더 큰 기지개를 켤 것이다. 뿌리를 단단히 곧추 세우면 공중을 향한 쉼 없는 성장으로 허공마저 움켜 쥔 들판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밟아 달라는 외침이 들리기 시작한다.
산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힘이라는 요소가 얼마만한 분량으로, 어디로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가에 따라 성장 여부가 지속되는 일이다. 힘이 과도하게 남발되거나 필요 이상의 간섭이 발생할 때 풍선 효과를 넘어 불신과 풍자가 넘실대는 사회로 전락한다. 과도한 힘의 낭비는 결국 국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야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소중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발밑의 웅성거림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적절한 압력을 달라는 뜻일 게다. 필요한 곳에는 이런 힘이 분배되어 착근(着根)을 유도하는 것이 평화이며 민주이다. 지금 우리 교단 현실이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는 까닭은 검증 없는 정치적 재단(裁斷)과 외부의 허풍에 의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는 교육 시스템 때문이다. 한 두 사람의 즉흥적 결단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이 몰고 오는 부작용과 현실적 장애를 가진 정책들이 실전용 폭탄처럼 투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절한 힘의 원주율을 다시 생각한다. 균등한 힘의 나눔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위적인 나눔의 봄은 가능하다. 봄의 시작이 바람일 수도, 양지 바른 텃밭의 벼룩나물일 수도 있고, 삼월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들의 소맷자락일 수도 있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어쨌든 삼월은 봄이고 시작이다. 적절하고도 고른 봄 햇살이 어둠과 밝음을 소외 없이 파고드는 것처럼 힘의 분배가 구석구석 필요한 이 따스한 봄날이다.
저작권자 © 호남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