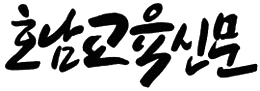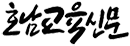겨울은 해도 짧다. 볕기(-氣)가 약해지는 해름 참이면 녹았던 마당이 얼기 시작했고, 처마 끝에선 고드름이 길어졌다. 설의(雪意)가 보이면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일찍 지어먹고 따뜻한 구들방에서 겨울밤을 보내야 했다.
학창 시절, 밤도 깊어서다. ‘스스슥 슥 스슥’ 지창(紙窓)에 들리는 소리에 가만히 방문을 연다. 마당도 지붕도 하늘도 하얗다. 대나무도 눈을 받아 이고 있다. 세상이 온통 눈빛이다. 다시 정적(靜寂)을 깨는 그 소리를 따라가니 대밭에서 함박눈 흘러내리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풍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절하고 있는 대나무들이다. 함박눈 오시는 밤에는 대나무도 신선이 되는가, 구부정한 모습으로 백운(白雲)을 타고 떠가는 것 같다.
화롯불도 사그라졌다. 숭늉 한 모금으론 달랠 수 없게 뱃속은 출출했다. 나는 방학 숙제를 하다가 마루에 서서 ‘어매, 흰쌀이나 저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면 쓰것네.’ 하면서 큰방으로 갔다.
“밥이나 한 술 먹을래…….”
어머니의 말씀이다. 내가 작은방에서 건너온 속내를 알고는 아랫목에 싸두었던 밥그릇을 꺼내 놓으셨다. 저녁 먹고 남은 밥을 묻어두었던 것이다. 바느질손을 밀치고 부엌에서 무청을 달고 있는 싱건지를 대접에 담아오셨다. 밥 한 덩이와 싱건지 한 대접, 호롱불 밑에서 격식도 없이 달게 먹었다.
숟갈을 이용해서 박속나물 훑어내듯 떼어내 한 입 넣고 아삭아삭 깨물어 먹었다. 간이 삼삼한 싱건지와 밥의 궁합은 일품이었다. 통째로 놓고 먹던 그 담백한 맛은 원초적인 맛이요, 모든 맛의 원형이었을까. 지금도 그 싱건지를 생각하면 입 안에 침이 한입 돌곤 한다. 정제바라지〔부엌문〕틈새로 받아들인 설월(雪月)과 아궁이의 온기로 부엌에서 익은 싱건지였다.
맛도 분위기를 타는가 보다. 함박눈 오시는 밤에는 문풍지도 울음을 멎는다. 사방 천지가 정밀감에 싸이면 눈 덮인 초가집 구들방에선 더없이 푸근함을 느낀다. 어머니 품안이 이처럼 푸근했을까, 소꿉놀이 하던 때 짚가리 속이 이렇게 아늑했던가. 온돌방에서 싱건지와 따스한 쌀밥이 만나 담백한 맛을 빚어내고 있다. 시원한 김칫국물 한 모금을 곁들이면서 말이다.
그때는 김장도 한철 농사였다. 그리도 춥던 날, 동네 우물터에서 널벅지에 샘물을 퍼서 무를 씻었다. 물에선 모락모락 김이 났지만, 손은 곱아 발개져서 김장하던 우물터 모습은 풍속도 한 폭이었다. 씻은 김장 무가 반석 위에 쌓이면 바지게에 정갈한 짚을 깔고 집으로 이내 옮겨졌다.
싱건지를 담그던 방법은 단순했다. 김칫독은 미리 정갈하게 씻어두었다가 독 안에 불을 지펴서 한 번 둘러냈다. 무를 정성스레 독에 안치며 해묵힌 소금으로 간을 하고, 샘의 가운데서 속물을 길러다 부었다. 여기에 마늘과 통고추가 양념으로 더해지면 그만이다. 김칫독에 그득그득 담아 부엌에서 숙성시켰던 것이다.
무의 그 담박(淡泊)한 맛을 나는 좋아한다. 지금은 그런 싱건지를 대하기가 쉽지 않다. 음식 맛을 돕는 양념이 무보다 앞장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무가 제 맛을 내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무는 채근(菜根)이다. 싱건지 맛에서 엉뚱하게 채근담의 가르침이 떠오른다, ‘세속(世俗) 안에 있으면서 세속을 떠나는 것이 좋다.’는. 어쩌랴. 짝퉁 고춧가루 범벅이 우리 혀를 마비시키고 있지만 그 속에서 순수한 제 맛을 찾아볼 수밖에는 딴 도리가 없지 않은가.
겨울 밤참으로 먹던 싱건지는 기억 속의 맛이 되고 말았다. 내게는 그게 겨울의 별미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