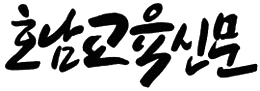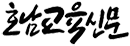눈을 감으면 손금마다 기억의
조용한 강물이 흐르고
이제는 너와 나
은은한 매화 향같이 떠가는
한 오리 흰 구름인가
고등학교 졸업 앨범 편집 후기의 한 구절이다. 벌써 35년 전의 앨범을 펼쳐든 것은 고3 때의 담임 박흥철 선생님께서 정년을 맞으신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아나 고3 담임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서, 마음 깊이 간직한 추억 또한 남다른 것 같다.
앨범을 넘기며 기억의 강물을 따라 머리칼을 파르라니 깎았던 까까머리 고교생이 되어보는 것이다. 교복에 명찰을 달고, 사철 교모를 쓰고, 들고 다니던 가방엔 책이 가득 담겨 있어, 학생이라는 신분만으로도 약간의 특권(?)을 누렸던 시절이 아니던가.
모교는 본관을 중심으로 별관들이 지형에 맞춰 자리하고 있었다. 별관에서 이태를 보내고 3학년이 되어서야 본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의 두 반 인원에 가까운 72명이 한 반이 되어 맞이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큰형같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선생님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가끔 대학 시절 교복도 입고 출근하셨고, 하얀 가운을 입고 교단에 서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싸우는 목적은 이기는 데 있다. 1분 1초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교실을 도서관화하고, 실내의 분위기는 정숙이다.”
학급 담임으로서 하신 첫 말씀으로 대입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금 교육계는 대입시 경쟁의 원리를 교육개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다. 지난날엔 고액 과외 같은 사회 문제는 없었지만 당시에도 입시 경쟁은 대단 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학교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고, 도서관은 자정이 넘도록 열려져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새 학년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부터 담배도 끊고, 우리와 친해져서 공부가 잘되게 하려고 삭발하는 심정으로 새 출발을 대비했던 것이다. 학교의 전통을 빛내자며 우리가 자만에 빠질 것을 경계하니, 우리들은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지 않았던가.
한일자로 다문 듯한 입에서 숨을 아끼며 쏟아 붇던 자긍심을 지키자던 당부. 유난히 가로로 넓은 글씨체. 젊음을 던지 열정이 넘치던 수업 시간. 그때는 선생님의 속 마음이야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선생님의 뜻에 못미치고 양에 차지 못했던 것만 같다.
그때 모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의로운 사람, 쓸모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선생님의 생활에서 본받은 바 많았을 것이니 지금 우리는 배운 대로 실펀하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 선생님의 교육 근저에는 모교의 교훈인 학행일치의 철학이 배어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교문을 들어서면 두 줄기 포플러가 흰 구름을 이고 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었다. 그 포플러 아래, 운동장 구석의 야구 그물에 내걸린 합격자를 알리던 방에서 이름 석 자를 발견, ‘합격의 기쁨’을 안으니, 그것은 감격이었고, 큰 꿈을 잉태시켰던 것이다. 곧이어 입학이 허가되니, 그 인연이 영원한 우리의 모교 광주고등학교와의 만남이 아니던가!
우리는 강당 겸 체육관인 홍익관(弘益館) 앞에 모여, 계림동산에 들어서기 위해 모교의 전통과 우리의 자긍심, 학교 생활의 기본 자세 등 소위 ‘광고인 정신(光高人 精神)’이란 걸 익혔다. 그때 본관동 중앙 첩탑엔 태극기가 힘차게 힘차게 휘날렸다. 그리고 화단엔 은행나무, 소나무, 철쭉, 영산홍, 파초 호랑이가시나무 들이 철따라 월령가를 불러주지 않았던가.
저쪽돌 층계에는 거목의 벚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내며 우리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었다. 우리는 굵고 힘찬 백선을 두른 모자에 장중한 모표를 달고, 이 나라의 동량재가 되겠다고 다짐도 했던 일들이 아련히 그립다.
“높 맑은 남쪽 하는 한가슴 안고 줄기찬 무등메에 희망도 크다. 홍익의 거룩한 뜻 모아 받들어 온 누리 빛내 나갈 젊은이라면, 보아라 우리 광고 여기 모였다.”
가슴을 펴고, 목청껏 불러댔던 새로 배운 교가다. 이 노래는 나에게 수필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도 수필의 길에서 이끌어 주시는 은사, 송규호 선생님께서 작사하신 것이다. 본관동과 도서관을 이어 주던 터널식 복도는 우리를 넘보거나 위압하지 않고 포근히 주인공으로 대접했다.
복도의 바깥에는 계림 동산의 사계(四季)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수목들이 가꾸어져 있어 더욱 아늑했다. 교정의 나무 전신주는 비바람을 맞으며 우리와 함께 교정을 지켰고 삼일관 뒤쪽 아카시아나무 무성한 동산은 우리들의 쉼터였다. 꿈 많던 고교 시절, 오월 속의 아카시아동산엔 사색과 대화가 함께 있다.
선생님께서는 세심한 부분까지 마음을 써 주셨다. 학년초 우리들의 주거 실태와 식생활에 대해 조사할 때 였다. 처음 자택을 손들게 하고, 다음으로 하숙생을 물으셨는데, 자택은 삼분의 일 정도였고 대부분이 하숙이라고 손을 들었다. 이제 남은 수는 손가락을 꼽을 만하니, 자취하던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다행히 그 다음은 더 묻지 않으셨다.
봄소풍 날이었다. 공부, 공부, 공부를 앞세우던 우리 반은 학교에서 출석을 부를 때는 절반 수나 되더니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다시 반수로 줄고 말았다. 빈손인 나와 친구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저쪽 소나무 숲 속으로 가고 있었는데 한 참 후에 선생님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어디 가냐며 함께 점심을 먹자고 권하는 선생님과 한자리에 앉았다. 반수는 점심을 가져오지 못 했으니 우리는 선생님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던 것이다.
그때 산 속에서 마주친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었음을 내가 교직에서 담임을 맡아본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졸업 앨범의 학급 사진 첫 장에는 우리들이 남긴 추억거리가 있다. 화학을 담당한 선생님께서는 육면체 벤젠고리 세 개를 위에, 그 밑에 두 개를 받치어 3학년 2반을 표시했다.
위쪽에 “정복”을, 가로에 “실천”을, 밑으로 급훈이었던 “말없는 길잡이가 되자”라고 써서 꼬리연 모양을 만들어 가운데 놓았다. 우리들은 사방에 한 마디씩 치기가 어린 말들을 남겼던 것이다.
“젊은이여 긍지를 가져라. 그대들의 앞날에는 탄탄한 길이 있다. 3의2 담임 박 장군 백. 점수는 점점 멀어져 갈 뿐이다. 인격은 성적이 아니다. 페이터의 산문을 다시 정독해 보게나.”
정년을 맞으시는 선생님께서는 가르치는 한 가지 일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니, 늦둥이 고교생 딸애와 중학생 아들의 손을 잡고 삶의 지혜를 일깨워 줄 때가 아닐는지……. 이런 생각을 하며 계림동산의 숲 속, 모교를 바라보니 은은한 매화 향같이 떠가는 한 오리 흰 구름이 마음에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