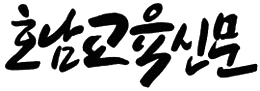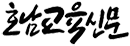독백이를 돌아 날갈이 앞에 당도하면 고향 마을이 죽림(竹林)에 묻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까지 오면 고향집에 닿은 거나 마찬가지다.
설이 내일 모레로 가까워 오자 어린것들은 눈 오는 날의 강아지처럼 좋아하며 할머니 곁으로 달렸다. 객지의 살붙이들이 모여들자 비워 두었던 사랑방 부엌 아궁이에서도 장작불이 활활 거렸다.
굴뚝 연기가 뒤란에 깔리면서 골목을 지나는 낯선 인기척에 이 집 저 집의 놀란 개들이 짖어대고 있었다. 어둠이 쌓이고 초가집 기스락의 고드름이 자라면서 섣달 그믐밤은 깊어 갔다. 이렇게 맞은 산골의 밤은 모처럼 늦게까지 방안의 불이 꺼질 줄 몰랐다. 밖에선 강추위가 씽씽 마른가지 사이를 지나고 있었지만, 문틈에선 도란도란 온정이 새어났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갖가지 객지 생활담에 희비가 엇갈리고 며느리는 설 쇨 채비에 바빴다.
떡가래를 써는 도마 소리가 지난날 어머님의 설빔을 준비하던 다듬이소리처럼 해조되면 바구니엔 떡국점이 소복이 쌓였다. 고르지 않게 썰린 떡국점이 발견되면 솜씨 자랑한다며 동서끼리 농담을 건네며 웃음판을 벌인다. 동기간의 우애가 한결 도타와지고 혈육 중한 줄도 깨닫는 시간이다.
아들과 며느리도 손님 같은 세상이 되었다. 한집에 함께 살면서 한솥밥을 먹어야 쓴맛 단맛을 함께 보며 미운 정 고운 정이 어우러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동기간도 삶의 터전 따라 뿔뿔이 흩어 놓고 있으니 명절이 없다면 서로의 정을 나누고 충전할 기회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런 의미로도 설은 옛날의 그것과 또 다른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다.
설은 우리네 정과 혼의 뿌리가 벋어 나는 대지랄 수 있지 않을까. 설 대목이면 수구초심으로 민족의 대이동은 연년이 이어지고 있다. 설은 분명 우리 생활에 활력소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띠면서 급변하는 현대 생활 속의 모든 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묵묵히 자아 성장을 위한 각자의 항행은 계속된다. 설 명절 같은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한마음 가득 채우기 때문이 아닐는지. 설은 일 년에 한 번, 지난날을 정리하고 내일을 설계하며 맞이하는 대 명절이다. 금의환향이 아니더라도 술병이나 들고 고기 근이나 뜨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날이기도 했다. 어디, 타관에서 생활하는 사람만 그러겠는가? 붙박이로 고향에서 농사만 짓는 집에서도 섣달 그믐날에는 빌려온 낫 한 자루, 헌 보습 한 장까지도 모두 제집으로 돌려보냈었다.
설날이면 어릴 적 세배 다녔던 기억을 새롭게 떠올리곤 한다. 어머니께서 손수 베틀에 앉아 한 올 한 올 정성으로 짜신 무명베에 검정물을 들여 만들어 주신 솜바지를 입고 세배를 다녔었다. 설날 아침 차례가 끝나면 동네 아이들은 너나없이 당산나무 밑으로 모였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으레 같은 또래끼리 세배꾼이 형성되었다. 설날 하루도 온 동네를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빠른 친구의 말을 좇아 세배드릴 집의 순서를 매기기도 했다. 그것은 음식이 모자라던 시절이어서 세배상의 푸짐한 정도를 고려한 어린 세배꾼들의 작전이었다.
어린 세배꾼도 상가(喪家)만은 먼저 들르는 가리사니는 있었다. 그런데 상가에서는 늘상 문제가 발생했다. 영우(靈宇)에 들러 예를 갖출 때 상주들의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가 왜 그리도 우스웠는지 모른다.
인사를 드리다가 세배꾼 중에서 끼룩끼룩 참았던 웃음보가 터지는 날에는 야단이었다. 엎드려 절을 하다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웃음을 진정시키느라 혀끝을 깨물기도 하였고 옆 사람의 애먼 엉덩이만 꼬집기도 했었다. 종국에는 어사 났다는 말을 들은 수령들의 꼬락서니로 맨발로 뛰쳐나오고 말았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수습이 되어 영우에서 나와 안방에 들러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면 걸게 차린 세배상이 우리들 앞에 놓여졌다. 어른들의 상보다 더 잘 차려 주시는 동네 할머니의 다스웠던 손길이 그리워진다.
“워따, 내 강아지들 많이들 먹소.”
귀애하시며 일일이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다.
“늬가 도산집네 두째지야. 몰라 보것다. 새해를 맞아 몸 성하고 공부 잘해라 와….”
덕담도 잊지 않으셨다. 온 동네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세배를 다녔으니 집집의 장맛을 보며 눈에 보이지 않은 유대감으로 동네가 똘똘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었다.그러던 것이 마을에 황소 앞세운 쟁기 대신 경운기가 탈탈탈 고샅길을 가로지르기 시작하면서 슬쩍슬쩍 세배 드리는 풍습이 사라지고 말았다.
요 근년에 설날에도 나이 드신 분들만 구시대의 유물인 양 세배를 다니신다. 지난날에 광은 비어 없이 살았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부자였다. 그때는 서로 말없는 가운데도 믿고 지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입은 옷이 호화스러워졌어도 안심이 안 되고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지금 등허리 다습다 해도 지난날의 고의적삼으로 동지섣달 설한풍을 인정으로 막으며 지녔던 미덕은 현재도 역시 미덕으로 숭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웃어른께 만수무강을 비는 마음으로 세배를 올리고 오가며 만나는 사람끼리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자며 서로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교환하면 사회는 얼마나 밝아질까.내 벌써 설이 돌아와도 고향 마을을 돌며 세배를 올려야 할 웃어른이 그리 많지 않게 되었다. 설이 가까워 오면 아버지의 뜨신 손길로 내 고사리 언 손을 꼬옥 쥐어주시던 어린 시절의 설날 풍습을 떠올리며 그런 감동적인 설을 경건하게 맞고 싶어진다.
다행스럽게도 고향에 고희를 넘기선 부모님께서 설날이면 세배를 받아 주신다. 오는 설날에도 부모님께 세배 올리고 어린것들의 손을 잡고 온 동네 세배 다닐 일로 벌써부터 마음이 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