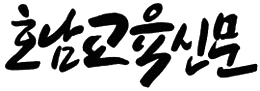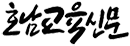6. 2지방선거를 앞둔 요즘, 발에 걸리는 것이 명함이다. 엊그제 예총회장 이 · 취임식 자리에 갔더니 하객보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차마 모른 척 지날 수 없어서 주는 대로 받았더니 호주머니는 온통 명함으로 넘쳐났다. 자신을 알리는 방편으로 명함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입지자들의 확신일 것이다.
중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명함은 얼굴 알리기에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차기 입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명함의 양면에 기록된 그 많은 공약들을 지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나치게 자신을 미화하거나 검증도 안 된 약속들을 쉽게 채워둔 것 같아 읽기에 불편하였다.
식목일을 며칠 앞두고 학교를 찾아온 모 대기업 사원이 내민 것은 명함이었다. 자기들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봉사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였다. 학생들의 생태학습을 돕기 위해 식목일 기념으로 화단을 조성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기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싶었다.
약속했던 날짜가 지났다.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 더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 그들은 봉사단체라는 명목으로 현수막 정도 걸고 삽질하는 사진이나 찍어 사보에 쓸 용도로 학교를 물색했던 것 아닐까? 아니면 철쭉 몇 그루 심어주고 식수 기념으로 팻말이나 남겨놓을 요량이었을까?
속셈이 궁금하였다. 책상 위에 그들이 두고 갔던 명함 앞면에 선명하게 박힌 전화번호를 누를까 하다가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자율과 희생을 생명으로 하는 대기업의 봉사단체가 실없는 농담을 하지 않으리란 믿음 때문이었다. 정말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들이 바람결에 나눈 대화의 한 대목이 문득 떠올랐다.
‘돈이 엄청 들겠는데......’
명함에서 명암이 엇갈린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