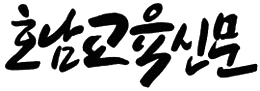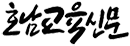학교를 옮겼다. 20대 중반에 교직에 들어선 이후 열다섯 번째 학교다. 이제 정년이 4년 남았으니 어쩌면 마지막 학교가 될지도 모르겠다. 익숙해질 때도 되었건만 인사 이동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긴장이 함께한다.
교사 시절에는 그곳이 어디건 아이들이 있으니 금세 녹아들 수 있었다. 그런데 관리자가 되고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낯선 공간, 학교마다 다른 문화와 교직원 사이에서 나를 알리고 자리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갈수록 힘들다.
공모 교장은 힘이 없다. 발령 순위가 기존 교장보다는 뒤, 신규 교장보다는 앞이다. 주는 대로 밥상을 받았더니 32학급, 8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대규모 학교이다. 지난 4년간 근무했던 7학급, 73명이 다니던 학교에 비해 열 배가 넘게 커졌다. 누구는 학교 규모만 보고 영전이라고 하지만 그건 교단의 실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경력자는 작은 학교로, 공모 교장이나 신규 교장이 큰 학교로 부임하는 게 대세가 되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학부모 민원에 시달릴 확률도 높아 일어난 현상이다.
이삿날을 받아놓은 날엔 비가 왔다. 작년 이맘때였더라면 환영받을 비지만 올해는 아니다. 1주일씩 이어지던 겨울비가 그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또 비다. 전날 밤부터 종일 내리는 데다 겨울비치고는 굵다. 이삿짐 대부분이 책이라서 예약된 용달차에 짐을 실을 순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승용차 석 대에 나눴다. 여동생 둘과 제부, 그리고 작은딸까지 와서 손을 보탰다. 책을 묶고, 옮기는 수고에 비하면 정리는 빠르게 끝났다. 사무실은 기존에 쓰던 곳보다 두 배나 넓었다. 짐을 다 부리고 나도, 공간이 많이 남았다.
고흥에서 공모 교장으로 4년을 보냈다. 행정 10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업무는 많고, 권한은 적은 교감을 6년이나 했으나 교장 발령은 요원하여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한 자리였다. 지역색 강하고, 학부모 민원이 많은 곳이라고 말리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났다.
뜻맞은 교직원과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알차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마지막 해에는 동문과 학생이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식도 있었고, 100년사 편찬에 마지막까지 힘을 보태 더 의미가 깊었다. 사람은 그만큼 살기 어려운데 학교는 살아남아서 100세 생일을 맞은 게 내 모교는 아니지만 감개무량했다.
아무리 정들어도 4년 이상을 근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미련이 남았다. 교직 성장의 한 획을 그은 그곳이 친정처럼 그리운 이름으로 남아서 참 다행이다.

새 학교는 삭막했다. 사방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운동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트인 공간이 아무 데도 없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사무실도 창틀이 높고 창이 좁아서 하루 종일 햇살 한줌도 들어오지 않았다.
고개만 들면 산과 하늘이 보이고, 교정인지 정원인지 분간이 안 가던 아름다운 학교에 익숙한 내 눈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로만 보였다. 나무 상자에 담긴 직사각형 텃밭에 심긴 작은 당근이 안쓰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학교 교목이 매실나무라더니 추위에도 얼굴을 내민 매화가 살짝 반가웠다.
이곳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살아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낯선 학교로 발령을 받았지만 이 또한 알 수 없는 인연의 힘이라면 정붙이고 살아 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리라. 봄이면 학교 뒤뜰에 산수유가 환하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면 벌떼가 윙윙거리고, 친구같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재잘대던 학교는 이젠 기억에서나 찾아야 한다. 모든 건 마음 먹기 나름. 도시와 농촌을 번갈아 가며 살 수 있는 이 행운에 감사해야겠지.
새 학교에 부임하고 3일째 되는 날, 눈을 뜨니 머리는 무겁고 콧구멍은 막혀 있었다. ‘딱 하루 푹 쉬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누르고 털고 일어나니 기다렸다는 듯 마른기침이 터지고, 콧물이 줄줄 흐른다. 그래도 개학 첫 주부터 쉴 수는 없다. 병가 하루 낸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다. 나를 아는 지인은 이런 나를 ‘미련곰탱이과’라며 답답해하지만 어쩌랴? 그래야 내 맘이 편한 것을.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문턱이 닳도록 선생님이 드나든다. 도서, 학습준비물, 방과 후, 상담, 특수, 환경 물품, 청소 용품, 녹색 어머니회, 늘봄 학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년 계획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들어오는 선생님의 이름도 다 외우지 못했는데, 과부하다.
멍한 머리에다 억지로 구겨 넣었더니 오후가 되니 감기 증상이 훨씬 심해졌다. 으슬으슬 춥고, 눈알이 빠질 듯 아파서 눈 뜨기도 힘들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고만 싶다. 된통 감기에 걸렸다.
신고식 한번 호되게 치른 1주일이 간다. 35년 전에 초임 발령을 받은 고향에서 교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초중고 학창 시절을 보냈고, 교사로 17년을 살았으니 익숙한 곳이지만 그래도 15년 만의 귀향이라 어색하기도 하다.
골골거리면서도 조퇴하지 않고 견딘 내가 대견하다. 아직은 낯설지만 머잖아 이곳은 곧 ‘우리 학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