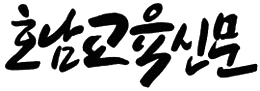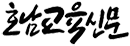녹동항의 차가운 안개비는
하늘과 바다를 잇는 잿빛 글라데이션을
한층 우중충한 분위기로 덧칠을 하고
거문도로 향하는 사람의 마음을 스산케 하였다.
3일 만에 풀렸다는 주의보!
출항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고
새벽잠을 설치고 달려와
5시간을 나뒹굴었던 대합실은
신출내기 섬사람의 코곯이 장소가 되었다.
바다는 현대판 방랑 자유인이
옛적 선비들의 유배 길을 사칭하는
가면 속의 비밀을 알아차렸을까?
기약 없던 바닷길이 어렵게 열렸다.
드디어 출항이다!
구명조끼는 캐비닛 사이를 빼꼼히 내다보며
안전을 당부하고 있었고
뜨끈한 객실 바닥은 큰대자로 누워 무의식의 파도를 타게 하였다.
정면의 유리창 너머 널린 풍경은
가상의 키를 잡고 운항하는 희열을 맛보게 하였다.
초도를 넘어서니
심해의 고유 색깔이 잿빛 하늘까지 침투하여 후련함을 제공하고
연록의 바다색은 마음을 녹이는 마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바람은 하얀 포말을 끊임없이 만들고
거대한 파도는 육중한 철선을 한입에 삼키려 애쓰지만
잘못 먹은 음식인 양 연신 내어 뱉기를 반복한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동도와 서도를 잇는 거문대교를 들어서니
어머니의 자궁 닮은 안락한 모습의 평화로움이 펼쳐진다.
세 개의 큰 섬들이 빙 둘러앉아 100만 평의 내해를 호수처럼 만들고
천혜의 항구를 앉혀 놓았다.
거문도에 도착했다!
巨門일거야?
처음 접한 거문은 분명 巨門이었다.
바닷길이 크게 열리던 시절
세계 각지의 열강들이
잠들어 있는 나라의 대문인 이곳을
우렁찬 뱃고동 소리로 깨웠었다.
그러나 巨門이 아닌 巨文이었다.
부동항을 탐낸 러시아에 맞선 영국의 선점을 제지하고자
청나라 제독이 들어와 巨文島라 하였다.
필담을 나누다 주민들의 문장에 탄복하여
섬의 이름까지 고쳤다 하지 않는가?
거문도는 육지에서 묻혀온 번뇌를 바닷길만큼 멀리 던져버리고
심신을 정화시켜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
임기를 마치면 머리는 텅 비고 대신 한가득 책이 남을 듯하다.
巨文島에서 巨文을 완성하여 책 수레를 끌고 바다를 다시 건너리.

최대욱∥거문중교장·교육학박사·전 한국교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