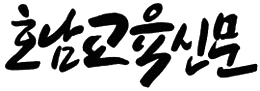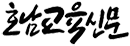‘유배’는 죄인을 귀양 보내는 일을 이르는 말이며 ‘귀양’은 죄인을 고향이 아닌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배에는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에 한해 유배 지역 내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유폐(幽閉)시키는 ‘안치(安置)’와 주위에 탱자나무를 심고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 ‘위리안치(圍籬安置)’가 있습니다. 안치가 위리안치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지는 대개 지역적으로 함경남도의 삼수(三水)와 갑산(甲山)과 같은 국경지역이 많았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섬 지방도 자주 이용됐습니다. 영조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흑산도와 같은 험한 곳이나 무인도에는 유배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유배형을 받은 사람은 100대의 형장(刑杖)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고통이 너무 커 유배지에 가기도 전에 사망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영조는 유배형에 처해져도 형장을 치지 않도록 하여 귀양 가는 자들의 고통을 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정치적 대립의 소용돌이에서 패배하게 되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귀양살이를 가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였습니다. '조선인명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귀양살이를 한 사람은 약 700여 명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인 178명이 섬과 오지(奧地)가 많은 전라남도에서 귀양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일부 학자들은 전라남도의 유배지적 사회 환경이 주민의식을 현실 비판적이고, 반집권적으로 변모시켰다는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치적 패배자들로서 당시 위정자나 집권층에 원한을 갖기 마련이며,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은연 중 그들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리(一理)가 있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대체로 식자(識者)들인 그들은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역 주민들을 훈육(訓育)함으로써 중앙의 수준 높은 문물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적잖게 주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의 한(恨)의 정서를 심어줌으로써 그 정신이 지역문화 형성에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 유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 서화(書畫)와 시문(時文)이 크게 발달한 전라남도의 문화적 특수성을 유배 문화와 견주어서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슬픔과 회한(悔恨)의 역사를 숙명처럼 안고 살면서도 유달리 불의에 맞서는 불같은 정의감이 지역민들의 토속적 심성과 기질로 형성된 이면에는 불행한 유배의 역사가 웅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역사적’으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실감하면서, ‘예향(藝鄕)’의 역사가 그 깊은 속살을 들춰내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볼품없는 책 상자는 나그네의 여장이라
어느 곳 청산인들 살면 못 살리
한림원 벼슬하던 꿈 이제는 아득해라
정약용의 '제보은산방(題寶恩山房)'에 나오는 글입니다. 다산은 강진 땅으로 유배돼 18년 동안 풍찬노숙(風餐露宿)의 영욕에 찬 삶을 이어갑니다.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 수많은 저술을 남기고 제자 18명을 키웠으며, 당대 조선의 최고의 학자로 자리매김하는 업적을 남깁니다. 이 밖에도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남겼으며 굴비를 탄생시킨 고려 인종 때 권신 이자겸이 영광 법성포로 유배됩니다. 또한 조선 중종 때 선비인 정암 조광조는 화순군으로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나주로 유배됩니다.
추사(秋史)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던 중 잠시 해남 대흥사에 들러 '무량수각'이라는 편액(扁額)을 남기며 윤선도 역시 제주도로 유배 가던 중 완도 보길도에 들렀다가 유배가 풀리고 난 후 보길도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이처럼 전라남도는 수많은 중앙 고위 관료가 유배를 오거나, 오가는 중 잠시 들러서 가는 경유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때마다 그들의 고매한 인품과 격조 높은 학식(學識)은 남도의 땅에 토착화되기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유배는 와신상담(臥薪嘗膽)하며 후일을 도모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과의 사별(死別)이라는 아픈 상처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사약(死藥)의 악몽이 항상 가슴 언저리를 기웃거립니다. 또한 그들의 집 주위를 둘러싼 탱자나무 가시보다 더 날카로운 쓸쓸함과 동거합니다. 신기루 같던 권불십년(權不十年)의 망령이 모질게 마음자락을 후빕니다. 인생무상(人生無常)이 물안개처럼 사무치게 번져 나갑니다.
필자(筆者)도 사실은 유배와 다름없는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덧나고, 매일 밤 악몽과 사투(死鬪)하며, 하루 종일 더없는 쓸쓸함 속에서 인생무상의 허허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어찌 유배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곁에는 선후배도, 동료도 없으며 재잘거리는 제자들 또한 없습니다. 찾는 이도 없고, 오는 이도 없습니다. 소위 소통하는 교육가족이 전무(全無)한 상황에서 그래도 교직에 근무하고 있으니 이 엄청난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시인 정호승의 '수선화에게'라는 싯구가 조금은 위안이 되는 늦가을 오후,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들추면서 한사코 내 골방에 들어와 버티고 있는 ‘고독’이란 고약한 녀석을 돌려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속에 갇히는 우(遇)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곤소곤 나에게 속삭여야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라고’